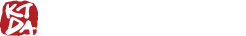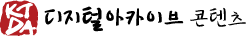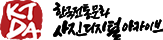절집 부엌, 공양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보리를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 오관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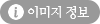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불과 물과 정성으로 밥을 짓는 절집 공양간. 통도사.

 Scroll Down
Scroll Down
공양간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절집의 하루
공양간의 불빛이 아침 해보다 일찍 어둠을 밝힙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아궁이와 벽, 천장
윤기 나게 닦인 솥과 나무주걱
하얗게 말라가던 행주
그리고 밤새 공양간을 채우던 차가운 공기
매일 아침 보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속세의 인연을 끊고 절에 들어와 수행자로서 처음 맡은 소임이기에
행자스님의 손길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속 조왕신이 빙그레 웃으며 스님을 내려다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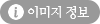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공양간에 들어오면 먼저 조왕신께 인사를 드린다.





정성과 온기로 짓는 밥
파삭!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공양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밥을 짓는 일은 따스한 온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랫목 이불 아래 덮여 있던 밥 한 그릇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데워지던 된장찌개
밥은 그리움이고 위로입니다.
맑은 물을 받아 하얀 쌀을 바락바락 씻습니다.
밥 짓는 소임을 맡은 공양주 스님의 힘찬 손길에 쌀뜨물이 뽀얗게 일어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토록 수고로움을 감수하진 않을 테지요.
함께 수행하는 스님들의 건강과 정진을 발원하며
온기를 품은 밥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 기꺼이 찬물에 손을 담아 따뜻한 밥을 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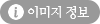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공양간 옆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밥을 할 때 가져다 불을 지핀다.
곧 수행이다
아궁이 속 불길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어느새 불길과 마음이 통하게 된 공양주 스님은
소리만 듣고도 불길의 강약을 알아차립니다.
공양간은 수행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세속의 번뇌와 잡념을 아궁이에 던져 버립니다.
탐욕과 화와 어리석음을 불길에 함께 태웁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심(下心)’을 배운 곳도 공양간입니다.
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가마솥은 쉼 없이 물을 뚝뚝 흘려댑니다.
스님은 몸을 한껏 낮추어 냄새를 맡아 뜸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 따뜻하게 채워줄 밥 한 그릇 짓기 위해
코끝에 검댕이가 묻고 안경에 뽀얀 김이 서리는 것도 아랑곳없이
더 몸을 낮추어 밥 냄새를 맡습니다.






마음으로 올린 상차림
허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밥을 그릇에 담습니다.
부처님 드실 밥, 조왕신 드실 밥 정성껏 담아 올리고
스님들 드실 밥도 고슬고슬 담아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맞게 밥을 담습니다.
채공 스님이 조물조물 무쳐온 나물반찬
갱두 스님이 끓여온 구수한 된장국
밥과 함께 단정히 상을 차려냅니다.
이제 됐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양주 스님이 공양간 문을 나섭니다.
손때 묻은 목탁을 두드려 온 가람의 아침을 깨우듯 청명한 소리를 울립니다.
아침 공양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밥을 공양하오니 보리를 이루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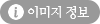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드디어 밥이 다 됐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을 그릇에 담는다.
공양간에 뜬 누룽지 보름달
밥을 퍼내고 난 가마솥에 노릇노릇 누룽지가 눌려 있습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누룽지를 긁어냅니다.
솜씨가 좋은 스님 손끝에서 빛깔 좋은 누룽지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공양간이 환해집니다.
부뚜막의 그을음을 걸레질로 닦고 가마솥을 박박 문질러 뒷정리를 합니다.
나무주걱까지 씻어 솥뚜껑에 줄지어 걸쳐놓으니
오래된 검은 그을음마저 물기를 머금은 듯 어여쁩니다.
일을 마친 공양주 스님의 얼굴이 발그레합니다.
합장해 조왕신께 인사 올리고 뒤돌아 공양간 문을 나섭니다.
드르륵. 새벽이 오기 전 그랬듯 공양간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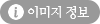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밥을 다 하고 나설 때도 공양간은 정갈해야 한다. 부뚜막과 가마솥을 걸레로 여러 번 문질러 닦고 나무주걱까지 씻어 솥뚜껑에 걸쳐 줄지어 놓는다. 밥 하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수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