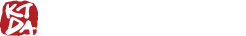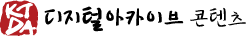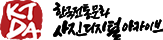스님의 하루
진리를 찾아, 참 ‘나’를 찾아 수행의 도정을 떠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멈추지 않고 걷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대자유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 믿습니다.
그 행복한 길 위에 선 수행자
스님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Scroll Down
Scroll Down






맑은 소리들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청정한 목탁 소리
스님은 도량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법당 앞에서 시작한 발걸음은 천천히 경내를 돌며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삼라만상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참으로 맑고 깨끗한 독경 소리!
스님은 목소리를 돋우어 산천초목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목탁은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번갈아 메아리치며
미혹 속에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깨웁니다.
다시 법당 앞에 이르러 세 번 목탁을 내려칠 즈음
맑디맑은 종송이 들려오고
곧 둥- 둥- 둥-
법고가 묵직하게 새벽하늘을 가릅니다.
운판과 목어, 범종도 육지와 하늘과 수중과 천상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발원을 담아 저마다 소리를 울립니다.
이렇듯 별빛처럼 아름다운 소리들로 스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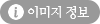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하늘은 푸른빛으로 새벽을 밝힌다. 새벽 3시, 스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스님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립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부처님 앞에 서면 마음은 절로 지극해집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낮추어
온 몸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 가장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에게 귀의합니다.
대중의 장엄한 합송에 내 목소리를 실어 예불문을 염송합니다.
정신은 서릿발처럼 맑아지고
자세는 가을하늘처럼 단정해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행의 도정 위에 서 있음을
스님은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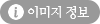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새벽예불이 시작되기 전 법당에서 종송이 울린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밥과 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반찬
드디어 공양 시간입니다.
죽비 소리에 맞추어 발우를 펴고 게송을 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깨어나 쉼 없이 움직였으니
배는 진작부터 고팠을 터.
그러나 스님의 발우에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음식만이 담깁니다.
입보다 가슴으로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땀방울을 생각하니 고마움이 차오르고
이 음식을 받을 만큼 정직하게 수고했던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솟습니다.
이 밥과 국과 찬이 지혜의 원천이 되기를,
수행의 에너지가 되기를,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힘이 되기를 발원하며 공양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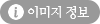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죽비 소리에 맞춰 발우를 펴고 게송을 읊는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밥이 수행의 원천이 되기를 발원한다.
마당에 비질을 합니다.
어지러운 마음 닦듯이 깨끗하게 비질을 합니다.
어느새 마당에 선명한 무늬로 남은 비질 자국
땀방울이 잠시 코끝에 머물다 또르르 떨어집니다.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은 매일 도량 안팎을 청소하며 번뇌를 쓸어내고
밭에 나가 김을 매며 세속의 욕심을 뽑아냅니다.
낡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일에 다함께 힘을 모으고
모두가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에 기꺼이 손길을 보탭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팔에, 다리에, 온몸에 건강한 기운이 깃듭니다.
스님에게 울력은 참으로 소중한 수행의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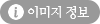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마당에 곱게 새겨진 비질 자국을 보면 스님의 마음이 번뇌로 차 있는지 한없이 평화로운지 알 수 있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전에 하루 한 끼 식사를 하셨던 부처님은
2500여 년이 흐른 오늘도 하루 한 끼, 사시(오전 9시~11시 사이)에 공양을 하십니다.
공들여 만든 맛있는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는 일,
즉 ‘마지’는 스님의 큰 소임 중 하나입니다.
입은 침묵으로 굳게 닫고
손은 바삐 움직여 정성을 다해 지은 밥을 불기에 담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받들어 큰 법당으로 향합니다.
자세 하나 흐트러질세라 발걸음 하나에 조심, 또 조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인자한 눈길로 스님을 맞아주십니다.
배고프실까봐 얼른 공양을 부처님 앞에 올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부처님.’
속엣 말로 인사드리니 왠지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천수경을 외우고 합장하여 절하며
스님은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부처님의 큰 뜻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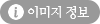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좌] 사시마지 시간이다. 생전에 하루 한 끼 식사를 하셨던 부처님께 사시에 공양을 올린다.
[우] 오른손으로 마지 그릇을 높이 받들어 부처님이 계신 법당으로 향한다.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르게 앉아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오로지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바람과 같아서 어디론가 달아나기 십상인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스님은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선지식을 모시고 승가의 가풍과 법도를 배웁니다.
경전과 어록을 읽으며 한 줄기 깨달음의 환한 빛을 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부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 순일한 본성을 되찾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합니다.
궁극적인 진리와 지혜를 목마르게 갈구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다리에 힘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님은 마당을 조용히 걸으며 포행합니다.
하늘을 떠가는 구름도 보고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한 바위도 보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어느새 온 몸에 조용히 힘이 차오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길이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스님은 다시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한결 맑아진 얼굴에 고요가 깃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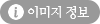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깨달음을 향한 공부에는 끝이 없다. 경전과 어록을 읽고 또 가슴에 새기며 공부한다.





산사는
어둠 속에 잠기고
도량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녁 공양에 이어 큰 법당에서 종송이 울리고
둥둥-. 쟁쟁-. 탁탁-. 댕댕-.
사물이 차례대로 제 목소리를 냅니다.
종성을 듣고서 번뇌를 끊고
지혜를 길러 보리심을 냄으로써
지옥을 여의고 삼계를 벗어나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를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옵니다.
밤 9시 취침을 알리는 종성이 울리기 전까지
못다 한 공부에 정진합니다.
이윽고 모든 불이 꺼진 산사는 고요 속에 잠깁니다.
스님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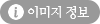
-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 범종이 둥둥- 큰 울림으로 하늘을 가로지른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또다시 사물을 울린다.